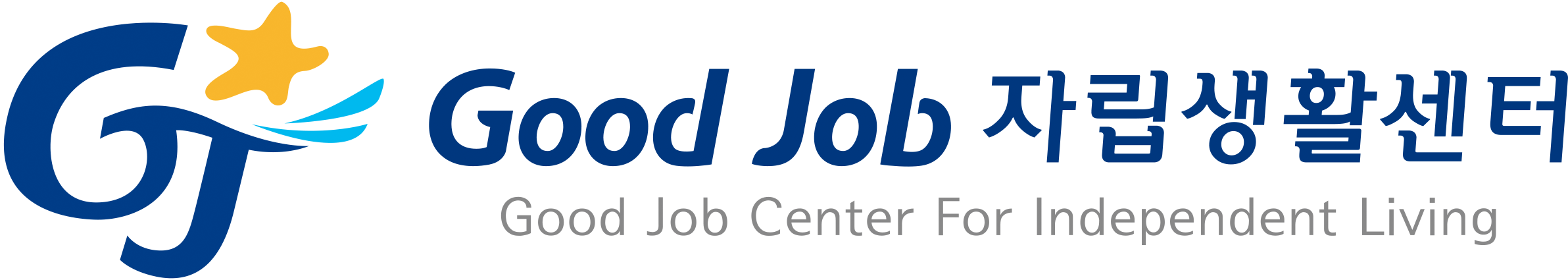삼국시대부터 조선말까지 장애인과 관련된 기록과 문헌을 수집해 정리한 책이 나왔다.
고려대 교양교직부 정창권 교수가 엮고 지은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글항아리 펴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까지 역사, 문화, 회화, 음악, 법률, 풍속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기록들을 가능한 한 모두 수집해 항목별로 정리했다.
우선 과거의 장애인 명칭을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을 잔질자(殘疾者, 몸에 병이 남아 있는 사람), 독질자(篤疾者, 매우 위독한 병이 있는 사람), 폐질자(廢疾者, 시각·청각·어각 및 일지 이상에 손상이 있는 사람) 등으로 기록했다.
과거에도 지금처럼 나름의 장애판정기준이 있었는데 <연산군일기>를 보면 잔질의 기준을 두고 신하들이 논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형법 조문에는 손가락 둘이 없거나 발가락 셋이 없거나 손발에 큰 엄지가락이 없는 사람을 잔질로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신하들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부러져 상한 곽비와 오른 손가락 셋에 화상을 입어 펴지 못하는 변규도 잔질로 인정해 변방으로 이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산군은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진휼 정책을 시행했다. 세종대왕은 거의 매년 장애인에 대한 진휼 정책을 펼쳤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특히 <세종실록>을 보면 “백성 중 나이 70세 이상 되는 자와 독질, 폐질, 잔질자에게는 장정 한 명을 주어 봉양하게 하라”라고 명하는 등, 장애인에게 지금의 활동보조인과 유사한 인력을 제공하려는 시책도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부양자 제공은 고려 시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려사>를 보면 원종은 “나이 80세 이상인 사람과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 등을 일컫는 말), 독질·폐질자에게 각기 봉양할 자를 한 사람을 주라”라고 명하고 있다.
부양자 제공은 가족 또는 친척 중 한 사람의 역(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수취하던 제도)을 면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시정(侍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고려사>를 보면 충렬왕이 “만약에 친척 가운데 호양(護養, 보호하여 기름)할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동서대비원으로 하여금 안집(安集, 평안하고 화목하게 함)시키고 국가에서 식량을 지급하며 관원을 보내어 제조토록 하라”라고 명하고 있어 관에서 부양자를 파견하는 예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들은 각종 부역, 연좌제 적용, 고문 등을 면제했고 감형제도도 시행했다.
<고려사>를 보면 문종이 살인죄를 저지른 시각장애인에게 율문의 예에 따라 사형을 감하고 유배를 보낸다는 내용이 있으며, <성종실록>을 보면 성종이 역모에 가담한 죄로 연좌제에 걸린 사람을 몰래 숨겨준 시각장애인 이검충에 대해 법으로 장애인은 형장으로 심문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런 상황과 관련된 형률을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체계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먹고 살기 힘든 장애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기록도 남아 있다.
<태종실록>을 보면 시각장애인 20여 명이, <세종실록>을 보면 시각장애인 114명이 임금의 수레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성일의 <학봉전집>에는 어사가 온다는 소식에 시각·청각·지체·지적장애인 등이 모여 군역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 장애인은 각종 부역에서 면제토록 해야 함에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국가는 이들을 대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여겨 점복, 독경, 음악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밖에도 이 책에서는 유형별 장애인, 장애인 직업, 장애인 왕족들, 장애인 관직 및 관료들, 유명한 장애 인물들, 장애인 예술가, 장애여성 등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